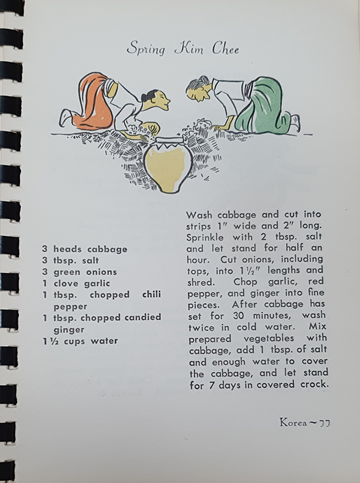한국음식은 어떻게 ‘한국음식’이 되는가?
2025년에는 김치, 된장, 한정식만이 한국음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치킨과 핫도그는 한국에 전파되어 십수 년간 현지화의 과정을 거쳤고 한국발 브랜드 치킨과 핫도그가 K푸드라는 기치 아래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일상에서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다종다양한 식재료, 조리법, 조리기술이 혼재하여 혼종일 수밖에 없는 음식은 공동체가 표방하는 전통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일상에서 되풀이되고 문화로 자리 잡는다.
즉, 음식의 다면적이고 다성적일 수밖에 없는 성질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혼종성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는 경향과 부딪히면서 일상의 습관과 언어로 남는다. 지은 카이에(Jieun Kaier)는 아시아 요리(특히 동북아시아)의 다언어적 맥락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민자 공동체의 세대별 요인에 따라 언어의 활용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밝혔다(Kaier, 2021). 1세대 이민자가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민자 공동체 내부에서만 소비하는 음식과 주류 현지인 소비자를 상정하여 상품화하는 음식을 묘사하는 양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후자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어떻게든 현지에 이해시키려 하는 이민자 공동체의 고민이 개입되며,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가까워 보이는 현지음식의 개념을 빌려온다. 이런 전면적인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은 개념은 조리법과 식재료를 넘어 확장된다. 김밥은 한국의 김밥임에도 일본의 스시와 비교·대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고, 김치, 피클 등 각국의 절임채소류는 각국을 대표해야 하므로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조리법을 정립하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택한다.
19~20세기 아시아·오리엔탈·에스닉 요리책
음식문화의 주요 사료가 되는 요리책은 요리법, 즉 레시피(recipe)를 포함한 책이다. 요리책은 요리법 이외에도 각 공동체나 민족·국가의 관습과 매너, 요리 기술의 발달 과정, 음식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Notaker, 2017). 그중에서도 출판인쇄 요리책은 주로 가정주부인 독자를 상정하여 출판사의 편집자와 저자가 독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편집한 결과물이며, 요리법을 통해 요리 기술의 전문성을 내포한 도구로 매개하기도 한다.
특히 새로운 이국의 음식을 선별하여 수록한 요리책은 지적 유희 충족과 문화 교류의 매개로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음식은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될 때 필수적으로 번역과 현지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적고, 양념 등의 식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국의 요리를 실은 요리책이나 요리 잡지 등은 글과 삽화로 이국성을 강조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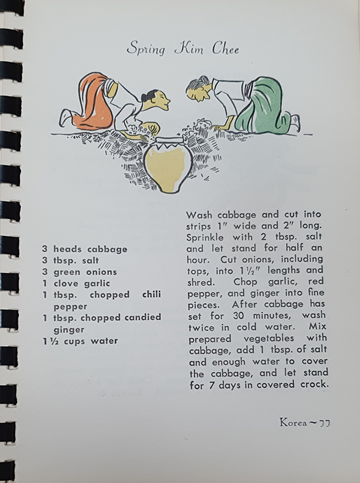
미지의 영역이며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둔 미국인 독자들을 위해 아시아나 오리엔탈에 해당하는 국가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인이나 유럽인, 혹은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해 온 영어에 능통한 ‘아시아인’ 저자는 가장 정통하고 고급에 해당하는 ‘아시아음식’을 소개하는 요리책을 저술했다.최초의 영문 오리엔탈 요리책은 1913년 튀르키예인인 저자(Ardashes H. Keoleian)가 저술했으며, 중국요리를 최초로 다룬 요리책은 이미 중국요리를 자주 경험해 보고 중국인 셰프와도 교류했던 현지인(Jessie Louise Nolton)이 저술했다. 1930년대부터는 점차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모두 미국 내 이민자들(주로 교수나 대사관)과 접촉하여 그들의 가정요리를 접해본 사람들이기도 했다. 전문 요리사였던 얼마 로스(Irma Ross)는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처음 중국인들과 중국요리와 대면했던 순간을 회고하며 요리책을 쓴 경위를 밝히기도 했다(Ross, 1955).
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서유럽 백인계가 아닌 이민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이민자 공동체는 다르지만 폭넓은 의미의 ‘이민자’의 범주에 묶였다. 중국과 일본은 별개의 국가였지만 유사한 아시아로 한 범주에 속하게 되었고, 단일 국가의 요리를 소개하는 요리책도 있었지만, 아시아를 확장하여 흥미롭고 매력적인 나라를 모두 엮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주가 활발했던 하와이 음식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역성도 아시아라는 범주에 속했다. 일례로, 1940년 하와이에서 출판된 요리책(Hawaiian and Pacific Foods)은 하와이, 사모아, 중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필리핀의 음식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중산층 주부가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량된 요리법이 실렸다. 당대 ‘주부(housewife)’에 해당하는 주류 백인 여성층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웃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몸에 좋고 이국적이며 흥미로운 음식을 요리하도록 하는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요리책은 이들을 위해 요리책의 구성을 재편했다.
음식을 둘러싼 양가적 관점: 혼종을 포용하는 딜레마
근대 가정학에서 심화한 영양학, 식품학 등 음식의 과학적인 접근은 새로운 지형을 불러왔다. 즉, 전문가들은 음식이 특정 영양분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국민의 복지에 적용했다. 또, 요리 관련 전문가들은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맛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정량화하고 정통의 모습을 일원화하고자 했다. 가정요리는 점차 미국 내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식품업·외식업과도 결부되었으며, 영양학·식품학과도 결합한 요리를 컬리너리 아트(culinary art)로 전문화하면서 요리책은 일상의 영역에서 교육용 교재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주류 백인의 취향도 함께 발굴되었다. 잠재 독자인 중산층 백인계의 입맛에 맞춰 각국과 각 민족의 요리는 선별되었다. 루마키(rumaki), 스키야키(sukiyaki), 데리야끼(teriyaki), 찹수에이(chopsuey), 차우미엔(chowmien), 완탕(wonton), 커리(curry), 처트니(chutney), 아도보(adobo), 김치(kim chee) 등 국가의 이미지를 표상화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식재료를 현지산으로 대체하고, 레시피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본지의 정통적인 맛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이국적인 식재료를 쓰고자 하는 저자의 실험정신도 추가되었다. 가장 독특하고 변별적인 맛을 내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오리엔탈(Oriental)’이라는 이름을 붙인 퓨전식 레시피가 등장했다. 이는 주로 오리엔탈 수프, 오리엔탈 샐러드 등의 이름으로 재현되었다.
음식의 혼종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시험대에 올라 비판을 받는 실험정신이 강한 요리들은 문화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는 여전히 사회에 뿌리내려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전지구화에서 요구받아 온 개방성과 포용성의 측면, 그리고 전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음식 내셔널리즘적 시각이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저자 소개
라연재(sayia817@gmail.com)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민속학(민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 위촉연구원으로 있다. 박사학위논문은 뉴욕시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음식의 한국다움(Koreanness)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음식학(food studies)이라는 학제간 연구 측면에서 현재의 음식문화와 음식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류문화사전의 집필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References
Ross, Irma W.. 1955. Recipes from the East, Tuttle Publishing Company.
Notaker, Henry. 2017. A history of Cookboo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iaer, Jieun. 2022. Delicious Words: East Asian Food Words in English. Routledge.